사카나(魚)와 일본(비릿 짭짤, 일본 어식 문화 이야기) - 서영찬
빨강머리 앤의 앤 셜리나 소공녀의 세라 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상상을 통해 느껴지는 재미를 종종 즐기는 편인데, 그렇기에 내가 느끼는 '책을 보면서 좋은 점'의 하나는 서술된 문장들 사이의 공백이 읽는 이로 하여금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상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주말마다 신문에서 책 소개 하는 지면을 보다가 접한 책이였는데, 책의 분량(두께)은 꽤 두툼했지만, 내용 자체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만큼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일단 저자의 방대한 연구와 지식에 감탄하며 맛깔 스러운 글솜씨에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멸치에서 부터 고래고기까지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에 대해 일본의 지역적 특색과 식습관 그리고 역사적 특징들을 버무려서 서술하고 있는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그래서 더 다채로운 물고기들에 대한 내용을 풀어낸 저자의 연구(?)와 입담이 대단해 보였다. 물고기의 맛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책에서 언급한 물고기 음식들을 먹으러 일본 여행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그렇다고 무슨 식물도감처럼 물고기들의 생물학적 특성만 기록된 책은 아니다. 어촌에서 배 타는 어르신들이 그물로 잡아 올린 물고기들에 대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맛인지에 대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같다 고나 할까.
다만, 한가지 옥에 티라고 한다면, 일본 관련 책을 쓰면, 소재가 역사/정치가 아니더라도 저자가 면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액땜이라도 하려는 듯 맥락과 무관하게 한두 곳에 일본에 대한 험담이 존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도 군데 군데 가볍게 언급되는데 굳이 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128) 튀김을 통칭하는 일본어는 아게모노다. 아게모노의 종류는 대체로 가라아게, 후라이, 덴푸라 세가지로 나뉜다. 가라아게는 밀가루, 전분을 묻혀 바로 묻혀 튀기는 것이고, 덴푸라는 밀가루나 전분에 계란이나 물을 더해 튀김옷을 만든다. 후라이는 덴푸라 조리방식에 밀가루 대신 빵가루를 묻혀주는 것이다. 빵가루의 유무가 후라이와 덴푸라의 차이를 만든다. 아무런 옷도 입히지 않고 바로 튀기는 것은 스아게 라고 한다.
일본 음식점을 가면 매번 메뉴판에 있는 이름 만으로 음식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튀김 음식을 뜻하는 서로 다른 용어들은 그저 식당 주인장의 표현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튀김옷과 튀기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스아게(바로 튀김) - 가라아게(밀가루, 전분) - 덴푸라(가라아게+계란) - 후라이(빵가루+계란) 이렇게 되는데 늘상 튀김은 아무생각 없이 바삭한 맛에 먹곤 했었는데, 앞으론 메뉴명을 통해 어떤 맛의 튀김일지 구분할수 있겠다 싶다. (맛만 있으면 되지 그게 무슨 큰의미겠냐 싶지만)
(145) 스시는 동사 스에루와 메시를 합성한 조어다. 스에루란 '음식물이 삭아 쉰 맛이 난다'는 뜻이고 메시는 밥이다. 따라서 스시는 밥이라는 재료와 삭힘이라는 과정을 수반하는 음식이다.
삭힌 생선의 비릿함은 인간 미각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붕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해당 내용이 설명되었는데, 삭힌 붕어에 밥을 조합한 음식이 비와호라는 호수 인근 지방에서 즐겨먹기 시작했고 이 음식의 비릿함이 우리나라 홍어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예전 네덜란드에 갔을때 먹었던 맛 보았던 청어 샌드위치가 기억이 난다. 빵 사이에 들어간 생선조각이 주는 강렬한 비주얼만큼이나 혓바닥에 남긴 비릿함과 이질적인 식감의 조합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깊었다. 당시 두 입 정도 먹다 버리면서, '이걸 왜 먹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익숙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한번 더 먹어보면 맛을 느낄수도 있을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비릿한 맛의 마력인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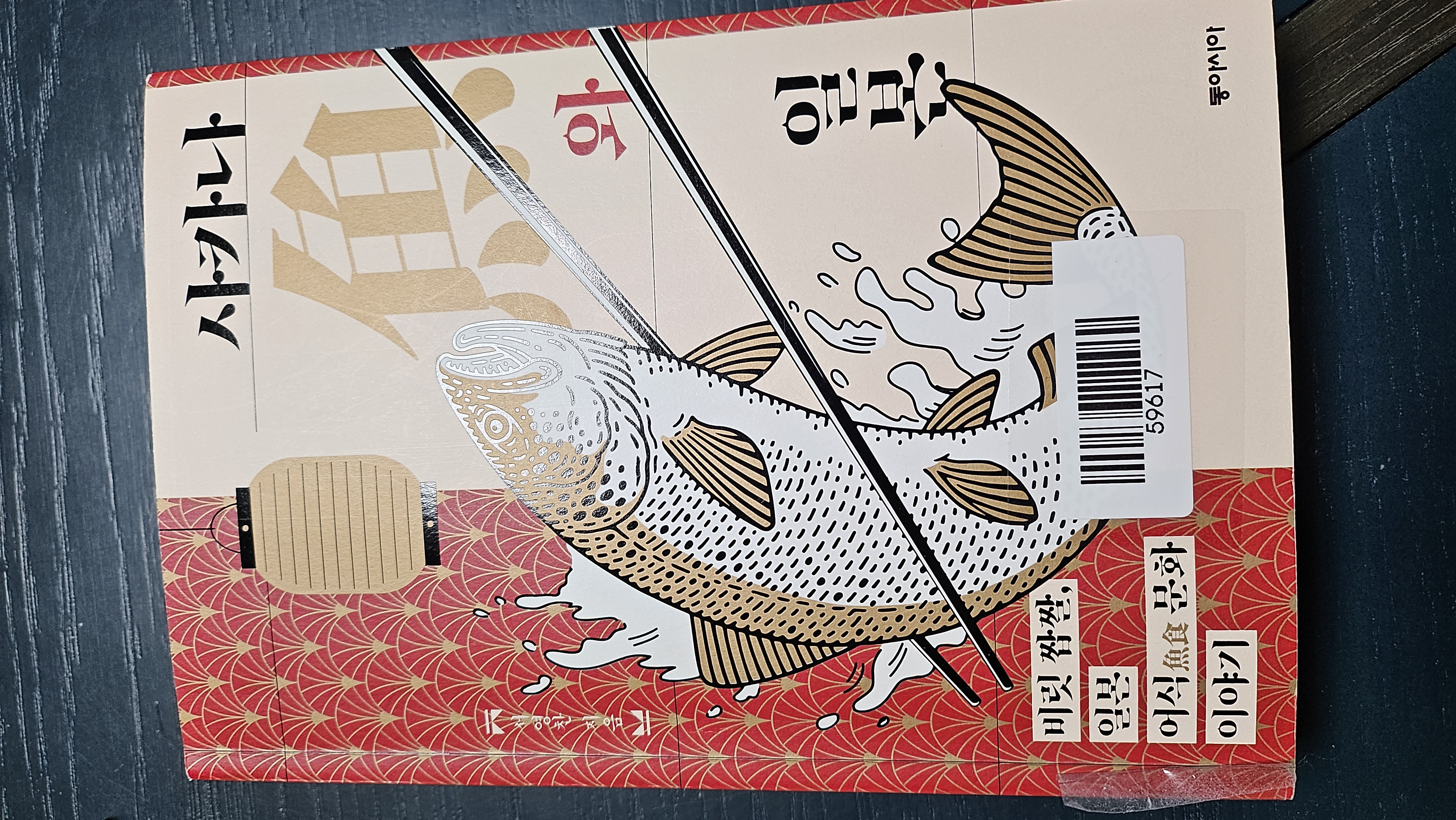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리의 힘 1, 2 (1) | 2025.05.14 |
|---|---|
|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1) | 2025.03.03 |
|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0) | 2025.02.08 |
| 룩 어게인, 변화를 만드는 힘 (0) | 2025.02.02 |
|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0) | 2025.01.23 |


